김 정 학 前)대구교육박물관장
여러 방송사에서 프로듀서로 일하면서 스무 해 넘게 ‘소리 잡는 일’을 해왔다. 어떤 소리가 멋진 소리이고, 좋은 소린지 애매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의미는 차치하고, 오로지 음질(音質)에만 매달린 적도 있었으며, 듣는 이의 입장은 헤아리지 못하고, 담은 노력 자체를 평가해달라고 볼멘 적도 많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시대는 놀라움의 연속이다. 낙엽 밟는 소리조차 경의로움을 전해주긴 하지만, 소리의 가치를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소리는 그 ‘존재’ 자체로 가치롭지 않은가.
불교사찰은 고요와 수행, 그리고 자연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 음성공양이 넘쳐나는 공간이다. 공양은 부처님에게 지극한 마음을 바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여섯 가지 공양(六法供養: 향, 꽃, 등, 차, 과일, 쌀)이 있는데, 여기에 제7의 공양으로 음성공양(音聲供養)이 더해지는 것이다. 음성공양을 제7의 공양이라 하는 까닭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순수한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사물(四物:범종, 법고, 목어, 운판), 독경(讀經)과 염불(念佛), 목탁, 예불소리, 풀벌레. 개울물. 산짐승, 송뢰(松籟), 도량석(약찬게, 토굴가, 참선곡), 종송, 경쇠, 죽비, 법당문 여닫는 소리, 감로수 따르는 소리, 여러 운력(運力)소리, 강원(講院)에서 들리는 소리, 후원의 나무타는 소리 등을 연신 잡으면서, ‘음성공양’의 상징적 개념을 넘어, ‘무정(無情)’들이 만들어 내는 소리도 음성공양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큰 실험을 한 셈이다.
이 실험을 “진리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삶과 자연 속에 이미 존재한다”는 뜻으로도 애써 해석하면서, “자연이 곧 진리를 담고 있으며, 깨달은 자는 어디에서나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다”는 선불교적 가르침에도 조금은 다가갔노라 스스로를 위로했던 적이 있었다.
소리를 잡으려, 소리를 쫒았던 시간 속에서, 어느 날 ‘위대한 소리’를 만났다. 그건 다름 아닌 범종(梵鐘)의 소리였다. 범종의 몸집도, 음색도, 반향도 놀라웠지만, 그 소리의 탄생도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사찰의 범종각을 스쳐 지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한국종의 전형인 신라범종의 소리는 고래 모양의 당목으로 당좌를 치면, 고래에 쫓기던 포뢰(葡牢)의 절규는 범종의 큰 몸속에서 회오리친다.
바닥을 친 종의 울림은 큰 몸 아래 묻혀있는 항아리나, 돌절구(臼)속에서 먼저 한차례 휘몰아치고선, 유곽내 유두들의 미세한 떨림에 이어 종의 몸 구석구석을 거치며 하늘로 향하고, 용통(음관)을 통해 나와 용뉴에서 포효한다. 그 용통은 다름 아닌 거센 파도를 잠재우는 신라의 피리, 바로 만파식적(萬波息笛)이다. 그 17cm 길이의 음관은 신라범종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종의 가장 독창적인 조형요소이다.
이제 그곳으로 나온 소리는 삼천대천세계를 울리며, 유정무정들을 깨우고, 지옥 중생마저도 깨우는 소리가 되는 것이다.
범종의 몸속에서 들끓는 소리는 범종 표면에 양각된 비천상의 틈새에서 가벼운 떨림으로 바뀌어선 더욱 오묘해지고, 아련히 이어지는 맥놀이의 시간을 늘린다. 종이 만들어질 때, 여러 종류의 쇳물이 굳어져 그 형태를 드러내면, 종장(鐘匠)은 캄캄한 종의 몸속으로 들어가 종의 살을 깍아내며, 소리를 다듬질한다.
신라인의 예술성과 부처님을 향한 불심이 만든 아름다운 비천상은 ‘줄탁동시’로 우리에게 훌륭한 종소리를 남긴다고 볼 수 있다. 그 누구도 쉽게 알 수 없는 비밀스런 작업이다.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는 8가지의 물리적이고도, 심리적인 요소(진동수,진폭,파형,길이,피치,음색,크기,잔향)로 신라범종의 아름다움을 과학적으로 계량화해보는 시도가 있었다. 음향학자인 KAIST 이병호 교수는 범종을 연구하면서, 주파수 공식을 만들어냈고,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과 분석을 통해 신라 범종의 소리에 점수를 매겼다.
이것은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함수를 시간 또는 공간의 주파수로 분해하는 ‘수치해석이론’이라고 했다. 이 방식으로 세계의 종소리를 분석하니, 런던의 빅벤, 모스크바 대종, 비엔나 대종 등의 점수를 상회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여음(餘音)에는 맥놀이라는 파동이 생기는데, 종이 크면 클수록 그 맥놀이의 피치가 커지는데, 맑고, 여음이 길고, 맑아야 좋은 종으로 평가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국립경주박물관을 들어서면 1200살 나이의 성덕대왕 신종이 있다. 높이 3.3m 두께 20.3cm 둘레 7m 무게 25톤. 그 거대한 모습뿐만 아니라, 얽혀진 전설만으로도 우리 가슴을 울리는 성덕대왕 신종. 우리는 이 종소리를 전국의 대형공연장에서 들을 수 있는데, 그 인연이 참 감동적이다. 그 일은 국립극장 무대과장을 지냈고, 환경음향연구소장이었던 음향전문가 김용국선생이 맡아서 한 일이었다.
그가 성덕대왕 신종에 대한 음향 분석을 하다가, ‘나 혼자 듣기에는 너무 아깝고, 극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국립극장의 예종과 본종으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맘먹었다고 한다. 지금도 그때 녹음한 종소리를 사용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누구라도 다시는 만들 수 없는 그 종소리의 엄청난 값어치를 알아버린 것이다.
오래전,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애썼던 적이 있었다. 연신 울어대는 개구리 소리를 잠재우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스탭의 구호에 맞춰 논바닥을 내려치던 그 여름의 짧은 시간을 기억한다. 그렇게도 잡으려고 애썼던 그 종소리, 그 자랑스럽고 느꺼워했던 그 종소리가 우리의 공연장에서 매일 울려퍼지고 있다. 그 범종소리를 잘 갈무리해주는 많은 분들이 고맙기 그지없다. 들으시는 분들은 큰 복 받으실 것이다.
생각해보니, 소리는 ‘영혼’이고, ‘가르침’이었다. 소리는 또 ‘역사’였다. 세상의 갖은 소리를 다루는 모든 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야 ‘소리’는 ‘잡아야 할’ 대상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다. 소리로 하여금 여러 생명을 깨닫게 하는 일,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

김 정 학 前)대구교육박물관장
∙ 1959년 대구출생
∙ 영남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 TBC 등 국내외 방송사 프로듀서(1989~2016) 지냄
∙ 천마아트센터 총감독(2009~2013) 지냄
∙ 구미문화예술회관 관장(2016~2017) 지냄
∙ 대구교육박물관 관장(2018~2023) 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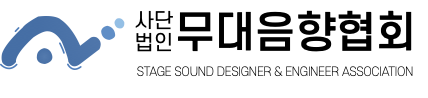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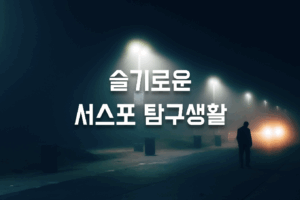

![협력사 탐방 #1 [(주)사운드 솔루션]](https://www.stagesoundkorea.com/wp-content/uploads/2025/04/SSM-14-스페셜리포트-사운드솔루션-1-300x200.jpeg)
![공연장 리모델링 사례 [서초문화예술회관]](https://www.stagesoundkorea.com/wp-content/uploads/2025/04/SSM-14-스페셜리포트-서초문예-1-300x200.jpg)




